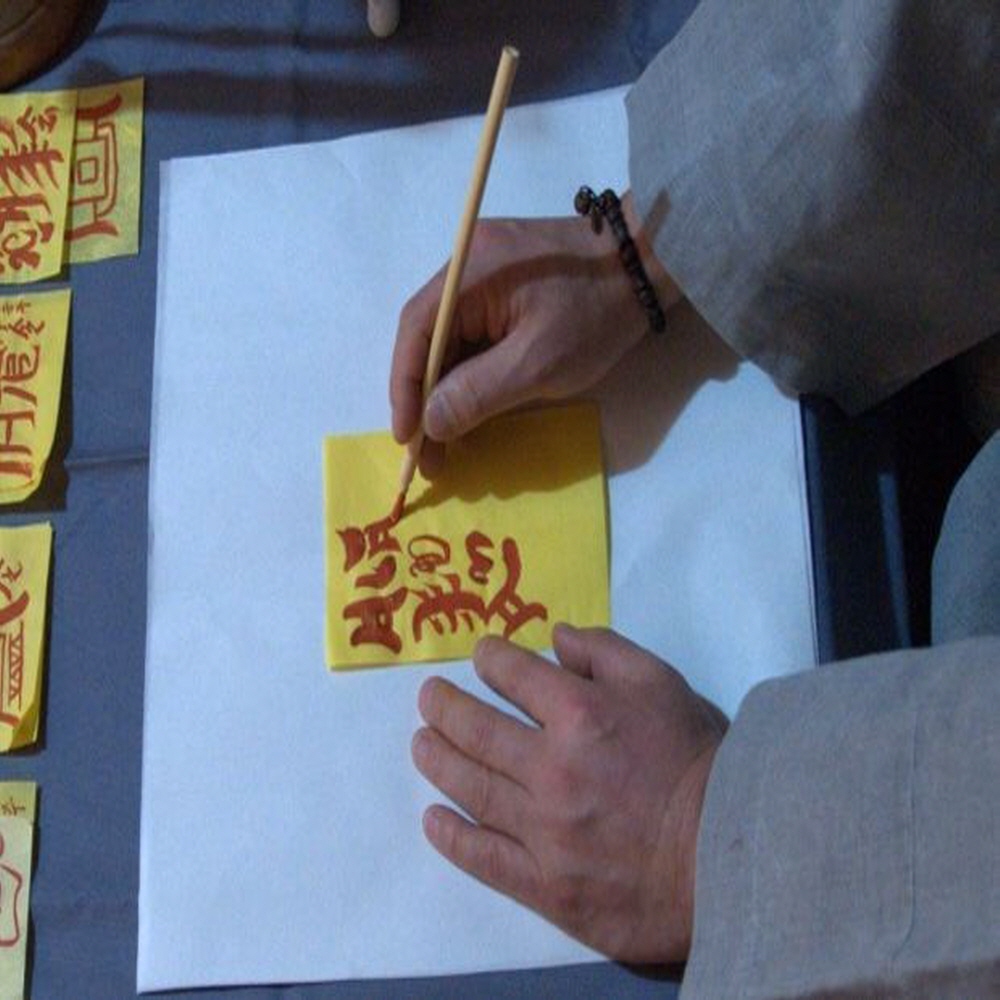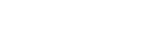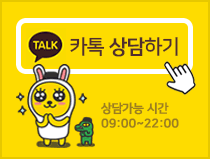불교용어 자료실 일본식 불교용어 - 홍사성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7-11 07:23 조회 33 댓글 0본문
일본식 불교용어
언어에 관한 일본사람들의 특기 가운데 하나는 기발한 조어(造語)와 축어(縮語)기술이다. 그들은 무슨 말이든 일본식으로 줄여서 쓰거나 변형해 쓰기를 좋아한다. 예를 들어 '가라로케'나 '비루'같은 말만 보아도 그렇다. 무인반주기(無人伴奏器)를 가리키는 가라오케는 '가라(空)'라는 일본말에 오케스트라의 앞말을 따서 만든 전형적인 일본식 조어다. 이에 비해 비루는 일본식 축어의 대표적인 사례다. 비루는 얼핏 들으면 맥주(Beer)를 의미하는 일본식 발음 같지만 사실은 빌딩(Building)을 줄인 축어다. 동경에 있는 '선샤인 비루'는 선샤인표 맥주가 아니라 선샤인 빌딩을 가리킨다.
이런 식의 조어 축어는 한문으로 된 불교용어에서도 나타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석존(釋尊)'이란 말이다. 석존은 석가세존(釋迦世尊)의 앞뒤글자 한자식을 따다가 만든 신조어다. 그들은 부처님의 생애를 서술한 전기물을 써놓고 <신석존전(新釋尊傳)>이라는 제목을 붙인다. 학자들의 논문을 보아도 부처님을 지칭할 때는 한결같이 석존으로 표기한다.
기분 나쁜 것은 이같은 불교용어가 일본불교의 모국(母國)을 자처하는 우리나라에서 아무 여과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불교학자들의 논문을 읽다보면 부처님을 지칭하는 일본식 조어표기법인 '석존'이란 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예가 허다하다. 그러다보니 학생은 물론이고 일반불자들도 어느새 석존이란 말을 우리말처럼 쓰고 있다.
일본식 불교용어 가운데 우리가 수입해 쓰고 있는 또 다른 불교용어로는 '포교(布敎)'라는 말이다. 이 말은 이제 너무 보편화돼서 우리나라 불교가 옛날부터 써오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불교사전을 보면 포교란 말은 중국 천태대사가 쓴 <법화현의(法華玄義)>에 나오는 '여래가 가르침을 편 원래의 뜻(如來布敎之元旨)'이란 문장에서 따온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일본학자들의 해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포교란 말보다 전법(傳法) 또는 홍법(弘法)이란 말을 사용했었다. 우리나라에서 포교란 말이 처음 쓰인 것은 놀랍게도 1884년 일본의 '포교승' 오꾸무라(奧村圓心)가 들어와 일본불교를 포교하면서 부터였다.
부처님을 석존이라고 부르든 불교의 전법활동을 포교라고 하든 그것이 무에 그리 중요하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또 문화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므로 오늘날 일본불교의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로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말이란 의식의 표현이고 말을 지배당하면 의식을 지배당한다. 우리 나라에 적당한 말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써야 할 판에 있는 말조차 일본풍을 따라 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욱이 일본의 불교문화 원류가 한국이라면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식 불교용어를 확립하려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될 것이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