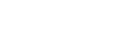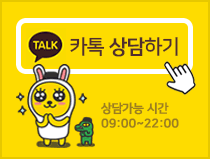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23-12-25 01:38 조회 167회 0건
본문
|
<사경이나 사불이나 수행에서 많은 부분 공통점이 있어 모셔 왔습니다.>
허 락 선생과의 인터뷰 일시 : 2006년 10월 22일 장소 :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에 여의주 사경원
동행자 : 운문사 명법스님, 사경전문가 이윤용 정진경,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정용남 학생
* 사경을 하게 된 동기 : 사경을 시작한지는 10년이 되었다. 부산 동래 전화국 앞에 있는 사무실에 갔는데, 가금(假金)으로 검은 종이에 쓰여 있는 글씨를 보고 금으로 쓰는 것이 좋아 보여 ‘나도 금으로 글씨를 써 봐야 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사경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곳 여의주 사경원((如意珠寫經院)에서 본격적으로 사경을 시작한 것은 양산 통도사의 700년 전에 경운스님이 사경한 법화경을 본 다음부터이다.
* 사경을 쓰는 방법 :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 하며 사경을 한다. 고려시대에는 고려 자체가 불교이고, 불교가 곧 사경이라고 말 할 수 있을 정도로 사경을 중시 하였다. 해인사 대장경의 경우 사경사만 2,500명이 참여하였고, 각(刻) 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참여하였다.
각을 한 사람은 군수도 있고 현감도 있다. 각 자체가 나라를 위하는 것이며 효도이고 공덕을 쌓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사경할 때 왜 비싼 금분을 사용하는가? 그것은 경전 자체가 부처님이기 때문이다. 사경은 불상과 같은 것이다. 전통적 사경법에 대해서는 선조로부터 전해오는 자료가 거의 없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연구를 해야 한다. 사경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습성(耐濕性), 접착제, 발색(發色)이다. 접착제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기 때문에 나름의 개발과 연구가 필요하다. 사경하는 사람마다 다른 접착제를 사용하고 있다.
물 아교, 우지, 수지, 찹쌀풀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물 아교는 잘 써지긴 하지만, 습기와 물기에 약하기 때문에 써서 배접 하지 못하고, 배접 한 후 써야 한다.
10년 이상을 넘기지 못하고, 다 떨어져 버린다. 우지는 일정 온도를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열을 가해야한다. 수지는 엄나무 껍질을 잘 고아서 조청처럼 만들어 물에 타서 쓴다.
찹쌀 풀은 만들기가 비교적 수월하다. 찹쌀 풀을 썩혀서 사용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글씨가 허예진다. 마르면 위를 상아로 닦아 윤을 낸다.
중국 원나라의 사경이나 일본의 국보급 사경들 중 고려 사경을 수입한 것이 많은데, 그 이유는 닥종이와 발색 기술이다. 먼저 닥종이는 화엄경의 경우 얇은 감지로 닥종이 양쪽을 배접했는데, 그 닥종이가 엄청나게 보드랍고, 뽀얗고, 하얗기가 마치 밀가루 같다. 다음은 발색이다.
금은 이중, 삼중의 색깔이 나기 때문에 고른 발색이 되기 어렵다. 고려 사경은 금이 감지 위에 말갛게 올라앉은 글씨이다. 이런 기술이 없으면 얼룩덜룩 해진다.
고려사경에는 발색의 특별한 기술이 있다. 먹과 달리 금가루는 종이에 두툼하게 묻어야 발색이 되며 시간이 지나면 접착제 효과가 떨어져 가루가 되기 쉽다.
붓과 한지, 접착제를 따로 만들어야했다. 2년간 금자경 연구가를 만나고, 운필법을 궁리하면서 5,400자 금강경을 20차례, 법화경7만자를 세 차례나 썼다. 그제야 금가루와 접착제의 적절한 배합과 운필법을 터득할 수 있었다.
2002년 1월부터 장경 사경작업을 시작해 4년 동안 하루에 13시간씩 매달려 세로 1.1㎝의 글자로 화엄경 81권(60만자), 금강경 1권, 지장경 2권, 법화경 7권(7만자) 등 91권의 경전을 썼다.
매일같이 1천800~1천900자를 썼다. 글자 수로 따지면 모두 69만 여자에 달하며 글자와 함께 경전 한 권, 한 권을 한 장의 그림으로 요약한 변상도(變相圖) 91점도 금으로 다시 그려졌다.
길이가 850여m이고, 금가루는 4㎏이 들어갔다. 금가루 값(1g에 3만2500원) 1억3000여만 원을 포함, 한지 등 재료값만 2억 원이 넘었다. 사경 뒤 교정을 본 뒤 오. 탈자는 2만자에 1자 정도였다. 고증을 통해 금 사경을 담는 그릇과 보자기도 만들었다.
* 사경을 할 때의 마음가짐과 신앙체험 : 사경은 예술차원을 넘어서 특이한 것이다. 사경은 취미나 문화가 아니라 생활이고 이념이며 이상이다. 미술의 한 장르나, 서예의 한 장르가 아니라 나 자신이며, 나 자신이 바로 불교인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경의 정신적인 측면이다. 잘 쓰고, 예쁘게 쓰고 등의 것은 차후의 것이다. 어떤 것을 몇 번 썼느냐 하는 ‘공덕’용 사경을 중요시 하는데 그것은 그냥 두어도 ‘공덕’이 되는 것을 ‘공덕’이라 이름 하면서 ‘공덕’을 깎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사경을 하면서 내가 발전하거나 업그레이드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모든 것은 명이 끝나고 날 때 변화가 생긴다. 내가 살아서 불보살의 가피를 입을 것이라 생각마라. 살아서 가피를 입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공덕을 남기는 것이다. 잘 될 생각 안 아플 생각 말라 윤회에 의해서 내가 사경할 프로그램이 입력되어 있는 것이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30퍼센트이고 인연이고 업장이다. ‘성불을 해야겠다.’ 생각하지 마라.
다 알고 계시니 잘못 하면 공염불이 되는 것이고 잘하면 공덕이 되는 것이다. 어느 기간을 정해서 하지 말고, 고려인들처럼 ‘생활사경’을 해야 한다. 내가 극락을 갈 지 지옥을 갈지 생각지 마라. 내가 명을 다 할 때 그 모습 그대로, 대나무의 마디 모양처럼 과거, 현재, 미래는 별도의 도막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는 천분의 일초도 끊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숨을 놓을 때 까지 사경을 하면 다음 생에서도 똑 같이 그렇게 된다. 사경은 하나도 정성, 둘도 정성, 셋도 정성이다.
정성 이하도 이상도 없다. 한 자 한 자를 쓰면서 그 한자가 바로 부처님을 모시는 것이라 생각한다. 식사시간, 사경하는 시간, 휴식 시간을 정해 놓고 완벽히 지킨다.
1~2시 까지 오수 시간을 갖고 밤에는 5시간을 잔다. 단전에 힘을 주고 사경을 한다. 사경과 호흡을 일치 시킨다. 사경을 하는 동안에는 서울에 있는 가족을 일 년에 두세 번만 만나고 작업에 몰두한다. 무념무상의 상태에서 오로지 불심 하나만으로 버틴다.
글 쓰는 것뿐 아니라 한지를 잇고 책으로 만드는 일도 만만치 않은 일이다. 한 치 오차 없이 경전을 이어나가고 접어야 한다. 사경을 하면서 수행 한다는 생각이 든 것은 경의 내용을 알아가면서 부터인데 사경 시작한지 5년 정도 되면서 부터이다.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이 눈물에서 단맛이 느껴졌고, 부처님이 이 말씀을 위해 그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금강경을 쓸 때 차제(次第)라는 말을 쓸 때 그것이 모두 평등이라는 뜻을 깨우치면서 눈물이 났다.
사경은 부처님의 원뜻을 생각하며 써야지 그냥 뜻을 모르고 써서는 안 된다. 5,400자 금강경을 20여 차례 쓰면서 쓸 때마다 느낌이 다른데 이것이 곧 발전이라 생각한다.
* 사경과 심신건강 : 허리와 팔의 통증에 시달리지만 불심을 일으키기 위한 작업이니 한 글자라도 허투루 할 수는 없다. 고도의 집중력이 없으면 오자나 탈자가 나서 애써 써놓은 사경을 버려야 할 때가 많으니 부동심 없이는 불가능하다.
특별한 건강관리법은 없는데, 사경을 하면서 건강은 더 좋아졌다. 음식에 대한 생각도 사경 전후가 많이 바뀌었다. 아무리 조악한 음식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 하찮은 음식이라도 부처님 덕이라 생각하여 버릴 수 없게 되고 입맛이 좋아졌다.
60세인데 어린아이 같은 감사의 마음이 생기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봐도 너그러워진다. 예전의 잘못을 생각하면 지금의 내가 고맙다. 이것이 바로 사경의 힘이며 불보살의 가피이다. 보살 생활을 하면 마음이 순수해 진다.
* 사경을 안 한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 : 사경을 하면 든든한 백이 생기는 것이다. 사경을 하면서 나쁜 기운이 빠져 나쁜 인연은 빠지고 좋은 인연을 만나서 좋은 일이 생기게 된다. 사경의 보급을 위해 내년 봄이나, 후년 가을에 전시회를 할 계획이다.
|
- 이전글마곡사 23.12.25
- 다음글백. 팔. 참. 배 23.12.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