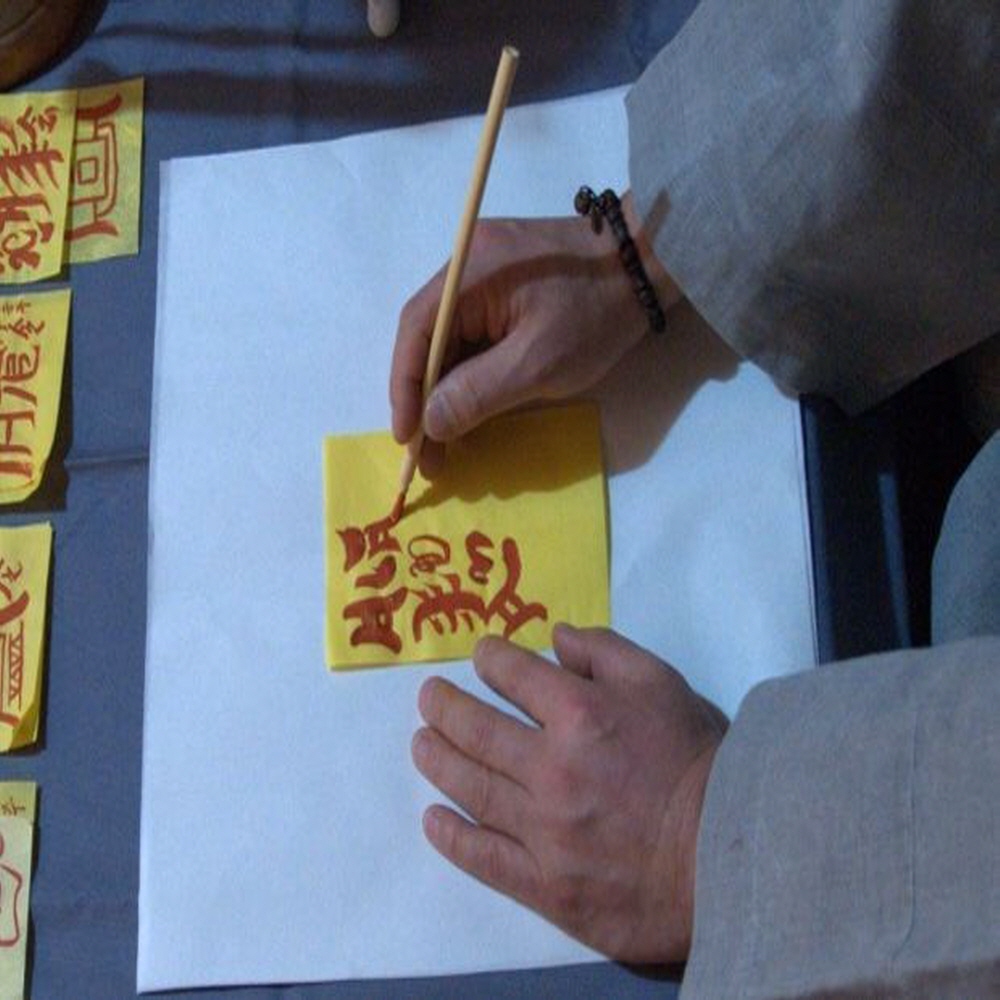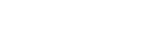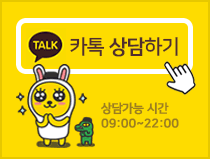한국불교의 이해 업과 감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2-07 17:17 조회 175 댓글 0본문
업과 감정
달라이 라마(티벳 승왕)
불교의 무아론(無我論)을 해석하는 방식은 학파마다 서로 다릅니다. 그 해석에 따라서 번뇌의 본질도 각각 다르게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독립논증중관파(獨立論證中觀派, Svāantrika)'와 '유식학파'의 경우에는 어떤 상태의 마음, 어떤 생각들, 어떤 감정들은 망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귀류논증중관파'의 경우에는 그것들 을 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해서,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번뇌가 우리의 근본적인 적(敵)이고, 고통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입니다. 마음에 번뇌가 생기는 즉시 마음의 평화는 깨지고, 나중엔 건강도 해치고 남들과의 우정도 깨뜨 립니다. 생명을 죽이고, 위협하고, 속이는 등의 부정적인 행동은 모든 번뇌에서 생깁니다.
그러므로, 번 뇌는 우리의 적입니다.
외부의 적은 오늘은 내게 피해를 입히더라도 내일은 상황이 바뀌어서 내게 큰 도움을 줄 수도 있습 니다. 그러나 내면의 적은 계속해서 파괴적입니다.
더구나,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면의 적은 언제나 나 와 함께 머물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와 반대로 외부의 적과는 항상 거리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 를 들어, 1959년에 티벳인들은 티벳을 탈출했습니다. 그 탈출은 육체적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내면 의 적은 내가 티벳에 있든, 포탈라 궁전에 있든, 다람살라에 있든,
런던에 있든, 어디를 가든 나를 따라 옵니다. 내면의 적은 명상할 때조차도 나와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만달라를 관상하는 동안에도 만다라의 중심부에서 그 내면의 적을 발견할 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는 자는 항상 우리 내면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라는 것이 제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내면의 적을 쫓아내거나 뿌리뽑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수행 따위 는 아예 잊어버리고 술이나 섹스에 의지해서 살든지 세속적인 사업이나 번창시킬 궁리를 하는 게 더 나 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적을 뿌리뽑는 것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인간의 몸과 두뇌, 선량한 마음 을 갖고 태어난 기회를 활용해서 그 힘들을 모아 내면의 적을 약화시키고, 종국에는 뿌리를 뽑아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불교에서는 인간의 삶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삶만이 지성 과 논리의 힘으로 마음을 단련하고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두 종류의 감정을 구분합니다. 한 종류는 이성적이지 못하고 선입견에만 입각한 것입니 다. 미움은 그런 종류에 속합니다. 이런 조율의 감정은 아주 얄팍한 이성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를테 면, '이 사람이 나를 무척 속상하게 했어'라는 식의 얄팍한 이성에 근거를 둔 감정입니다. 그러나 곧 그 감정을 뒷받침해 줄 더 깊은 이성을 찾아낼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올바른 이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감정들을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조율의 감정은 이성을 갖춘 감정입니다. 자비심과 이타심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런 감정들을 깊이 분석하면, 그 감정이 좋고, 필요하고, 유용하다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이성을 갖춘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 감정들은 본질적으로는 감정의 일종이지만, 실제로는 이성이나 지성과 조화를 이룹니다. 실 제로, 지성과 감정이 결합해야만 우리의 내면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면의 적이 있는 한, 또 우리가 그 적에게 지배되는 한, 영원한 평화는 올 수 없습니다. 이 적을 물리 칠 필요성을 아는 것이 진정한 자각이며, 이 적을 물리치기를 열렬히 원하는 것이 해탈에 대한 열망입 니다. 불교용어로는 '윤회를 버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과 내면세계를 분석하는 수행이 매 우 중요합니다.
첫째 단계의 고통인 '고통스러운 고통'을 벗어나려는 욕구는 동물들도 본증적으로 지니고 있다고 불 교 경전은 말합니다. 둘째 단계의 고통인 '변화하는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열망은 불교 수행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 인도에서는 비(非)불교 수행자들도 삼매(三昧)를 통해서 내면의 고요를 찾았습니 다. 그러나 윤회에서 완전히 해탈하려는 열망은 셋째 단계의 고통, 즉 '윤회에 편재하는 고통'을 인식한 후에만 생깁니다.
즉, 무지가 우리를 지배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기쁨 과 행복이 들어설 여지가 없음을 깨달은 다음에야 해탈에 대한 열망이 생깁니다.
세 번째 단계인 '윤회 에 편재하는 고통'을 깨닫는 것은 불교 수행만이 갖고 있는 독특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편안하십시요
마하반야바라밀
보디삿트와 합장 (),,,,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