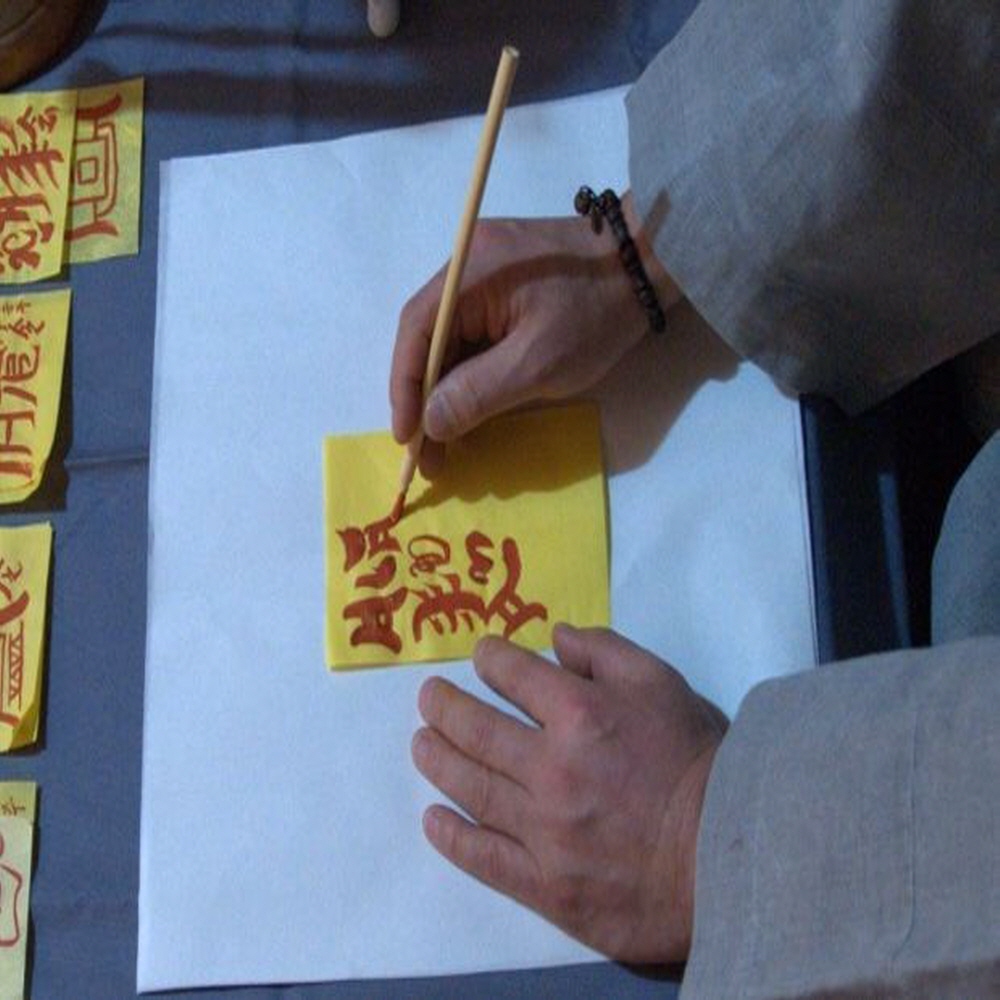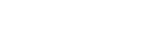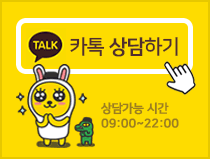경전불보살님 말씀 붓다의 옛길 - 팔정도의 세 가지 측면 (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2-14 21:38 조회 453 댓글 0본문
열반에 즈음하여 붓다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설했다.
"내가 죽은 뒤에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설하고 정해 놓은 법과 계율을 스승으로 삼아라."
(장부 16. Mahaparinibbana-sutta)
이것으로 볼 때 붓다의 생활 방식과 종교 체계는 법과 계율로 구성되어 있음이 확실하다. 계율은
말과 육체적인 행위를 잘 길들여 도적적으로 뛰어나게 하는 것으로, 불교에서 가르치는 행위에 대한
규범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선행의 훈련 또는 도덕적인 훈련을 의미하는 계(戒)라고 알려져 있다.
법은 마음을 길들이는 인간의 정신적 훈련을 다룬다. 이것은 명상 즉 선정(定. 三昧)과 지혜의
수행이다.
이 세가지 즉 계율, 선정, 지혜는 중요한 가르침이다. 이 세 가지를 닦은 사람은 더 높은 정신
생활로, 어둠에서 빛으로, 격정에서 침착으로. 혼란에서 평정으로 갈 수 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행의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이러한 생각은
모든 시대 붓다들의 분명한 가르침 속에 구체화되어 있다.
"어떤 악도 짓지 말고, 선을 닦아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하라." (법구경 183)
자주 인용되지만 볼 때 마다 새로운 이 구절은 청정과 해탈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붓다의
메시지를 간결하게 전달해 준다. 이 길은 일반적으로 팔정도(八正道)라고 한다.
팔정도는 크게 계율, 선정, 지혜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것을 삼학(三學)이라고 한다.
이 팔정도는 불교에만 있는 고유한 것으로서 불교와 다른 종교, 철학을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
팔정도를 삼학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지혜 부분]
1. 올바른 견해 (正見. 정견)
2. 올바른 생각 (正思惟.정사유)
[계율 부분]
3. 올바른 말 (正語. 정어)
4. 올바른 행위 (正業.정업)
5. 올바른 생활 (正命. 정명)
[선정 부분]
6. 올바른 노력 (正精進. 정정진)
7. 올바른 주시 (正念. 정념)
8. 올바른 집중 (正定. 정정)
첫 설법에서 붓다는 팔정도를 언급하면서 이것을 중도(中道)라고 했다. 그것은 두 극단을 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비천하고 세속적인 감각적 쾌락에 탐닉하는 것은 해를 가져오니 한 극단이요, 고통스럽고
비천한 극단적 고행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것도 해를 가져오니 또 다른 극단이다.
노래와 춤, 사치와 쾌락에 빠진 생활을 해 본 보살(깨닫기 전의 붓다)은 경험을 통해 감각적 쾌락이
인류를 진정한 행복과 해탈로 이글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고행자로서 그는 엄격한 고행을 하고
6년 동안 청정과 궁극적인 해탈을 쫓아 열심히 수행했지만 아무런 보상도 없었다. 그것은 헛되고
무익한 노력이었다. 그래서 그는 이 두 극단을 피해 도덕적.정신적 수행의 길을 따라갔고, 자신의
체험을 통해 삼학으로 구성된 중도를 발견했다.
길이라는 말은 단지 비유적인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관습적으로 길을
밟는다고 말하지만 엄격히 말하자면 팔정도는 여덟 가지 정신적인 요소들을 말한다. 팔정도는 상호
의존적이고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높은 단계에서는 동시에 기능을 하며, 순차적으로
차례 차례 따라가거나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낮은 단계에서조차도 각각의 모든 요소들에는 어느
정도 올바른 견해(정견)가 가미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올바른 견해'는 불교의 요지이기 때문이다.
먼저 붓다의 말을 들어 보자.
"비구들아, 바로 네 가지(법)를 이해하지 못했고 통찰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와 나는 윤회 속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달려왔고, 그렇게 오랫동안 방황해 왔다. 그러면 네 가지란 무엇인가? 계율과
선정, 지혜, 해탈이 그것이다.
그러나 비구들아, 이 네 가지를 이해하고 통찰하여, 존재하려는 욕망을 근절 시키고, 새로운
생존으로 인도하는 것을 파괴하면 거기에는 더 이상 생존이 존재하지 않는다." (장부 16)
붓다는 덧붙여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비구들아, 계율이 뒷받침된 (계율을 두루 닦은) 선정은 많은 과보와 이익을 가져온다. 지혜가
뒷받침된 마음은 감각적 욕망의 도취로부터, 생종으로부터, 잘못된 견해와 무지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된다." (장부 16)
붓다의 이러한 언급은 삼학을 닦는 기능과 목적을 설명해 준다. 해탈이란 사람의 마음을 괴롭히는
악의 세 가지 근원적인 원인들인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貪嗔痴. 탐진치)이 사라지는 생생한
경험을 의미한다. 이 근원적인 원인들은 삼학을 닦음으로써 제거된다.
그러므로 붓다의 가르침은 최상의 청정, 완전한 정신적 건강, 모든 오염된 충동으로부터의
해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
정신적 번뇌로부터의 해탈, 병으로부터의 자유는 다른 인간이나 신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인간 자신의 손에 달려 있다. 붓다조차도 존재의 족쇄로부터 사람들을 풀어
줄 수 없다. 그도 단지 그들에게 풀려날 수 있는 길을 보여 줄 뿐이다.
설법들 속에서 세 가지 수행으로 언급되고 있는 계율, 선정, 지혜는 어느것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이들 각각은 목표로 가기 위한 수단들이다. 하나가 다른 것에 독립해서 기능할 수 없다.
삼각대에 다리 하나가 없으면 넘어지듯이 삼학에서도 다른 두 가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하나마저도
기능을 할 수 없다. 이 세 가지는 서로를 지탱해 주며 함께 간다.
계율 즉 절제된 행위는 선정을 강화시켜 주고 또한 선정은 지혜를 촉진 시킨다. 지혜는 사물에
대한 흐릿한 시야를 밝게 하여 있는 그대로 삶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지혜는 삶과, 삶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게 해 준다.
교리와 계율 또는 앎과 행위 상호 작용 속에서 그 두 가지는 서로 성장이라는 하나의 과정을
구성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손으로 손을 씻고 발로 발을 씻듯이, 행위는 지혜를 깨끗하게 해 주고, 지혜는 행위를 깨끗하게
해 준다." (장부 9)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붓다의 가르침을 단순한
사색이나, 실용적인 가치나 중요성이 없는 단순한 형이상학적인 교리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교도들에게 삶의 여정이란 말과 행위, 사고를 깨끗이 하는 강력한 과정이다. 그것은
스스로 계발하고 스스로 정화한다. 그것은 실용적인 결과를 강조하는 것이지 단순한 철학적
사색, 논리적인 추상 또는 단순한 생각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붓다는 그저 경전만 배우는 제자들에게 강한 어조로 경고 하였다.
"비록 신성한 경전들을 많이 암송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따라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경솔한 그는
다른 사람의 소를 세는 목동과 같다. 그는 수행장의 결실을 나누어 갖지 못한다."
"비록 경전을 조금밖에 암송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르침에 따라 행동하고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버리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마음이 완전히 해탈되어 이후로는 어떠한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면,
그는 수행자의 결실을 이룬다. " (법구경 19,20)
이러한 사실들은 무지로부터 완전한 지혜를 일깨우는 불교도들의 생활방식과 최상의 진리를 파악하는
방법은, 단순히 학술적인 지적 계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깨달음과 궁극적인 해탈로
인도해 주는 실용적인 가르침에 의존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 준다.
"내가 죽은 뒤에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설하고 정해 놓은 법과 계율을 스승으로 삼아라."
(장부 16. Mahaparinibbana-sutta)
이것으로 볼 때 붓다의 생활 방식과 종교 체계는 법과 계율로 구성되어 있음이 확실하다. 계율은
말과 육체적인 행위를 잘 길들여 도적적으로 뛰어나게 하는 것으로, 불교에서 가르치는 행위에 대한
규범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선행의 훈련 또는 도덕적인 훈련을 의미하는 계(戒)라고 알려져 있다.
법은 마음을 길들이는 인간의 정신적 훈련을 다룬다. 이것은 명상 즉 선정(定. 三昧)과 지혜의
수행이다.
이 세가지 즉 계율, 선정, 지혜는 중요한 가르침이다. 이 세 가지를 닦은 사람은 더 높은 정신
생활로, 어둠에서 빛으로, 격정에서 침착으로. 혼란에서 평정으로 갈 수 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행의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이러한 생각은
모든 시대 붓다들의 분명한 가르침 속에 구체화되어 있다.
"어떤 악도 짓지 말고, 선을 닦아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하라." (법구경 183)
자주 인용되지만 볼 때 마다 새로운 이 구절은 청정과 해탈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붓다의
메시지를 간결하게 전달해 준다. 이 길은 일반적으로 팔정도(八正道)라고 한다.
팔정도는 크게 계율, 선정, 지혜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것을 삼학(三學)이라고 한다.
이 팔정도는 불교에만 있는 고유한 것으로서 불교와 다른 종교, 철학을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
팔정도를 삼학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지혜 부분]
1. 올바른 견해 (正見. 정견)
2. 올바른 생각 (正思惟.정사유)
[계율 부분]
3. 올바른 말 (正語. 정어)
4. 올바른 행위 (正業.정업)
5. 올바른 생활 (正命. 정명)
[선정 부분]
6. 올바른 노력 (正精進. 정정진)
7. 올바른 주시 (正念. 정념)
8. 올바른 집중 (正定. 정정)
첫 설법에서 붓다는 팔정도를 언급하면서 이것을 중도(中道)라고 했다. 그것은 두 극단을 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비천하고 세속적인 감각적 쾌락에 탐닉하는 것은 해를 가져오니 한 극단이요, 고통스럽고
비천한 극단적 고행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것도 해를 가져오니 또 다른 극단이다.
노래와 춤, 사치와 쾌락에 빠진 생활을 해 본 보살(깨닫기 전의 붓다)은 경험을 통해 감각적 쾌락이
인류를 진정한 행복과 해탈로 이글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고행자로서 그는 엄격한 고행을 하고
6년 동안 청정과 궁극적인 해탈을 쫓아 열심히 수행했지만 아무런 보상도 없었다. 그것은 헛되고
무익한 노력이었다. 그래서 그는 이 두 극단을 피해 도덕적.정신적 수행의 길을 따라갔고, 자신의
체험을 통해 삼학으로 구성된 중도를 발견했다.
길이라는 말은 단지 비유적인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관습적으로 길을
밟는다고 말하지만 엄격히 말하자면 팔정도는 여덟 가지 정신적인 요소들을 말한다. 팔정도는 상호
의존적이고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높은 단계에서는 동시에 기능을 하며, 순차적으로
차례 차례 따라가거나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낮은 단계에서조차도 각각의 모든 요소들에는 어느
정도 올바른 견해(정견)가 가미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올바른 견해'는 불교의 요지이기 때문이다.
먼저 붓다의 말을 들어 보자.
"비구들아, 바로 네 가지(법)를 이해하지 못했고 통찰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와 나는 윤회 속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달려왔고, 그렇게 오랫동안 방황해 왔다. 그러면 네 가지란 무엇인가? 계율과
선정, 지혜, 해탈이 그것이다.
그러나 비구들아, 이 네 가지를 이해하고 통찰하여, 존재하려는 욕망을 근절 시키고, 새로운
생존으로 인도하는 것을 파괴하면 거기에는 더 이상 생존이 존재하지 않는다." (장부 16)
붓다는 덧붙여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비구들아, 계율이 뒷받침된 (계율을 두루 닦은) 선정은 많은 과보와 이익을 가져온다. 지혜가
뒷받침된 마음은 감각적 욕망의 도취로부터, 생종으로부터, 잘못된 견해와 무지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된다." (장부 16)
붓다의 이러한 언급은 삼학을 닦는 기능과 목적을 설명해 준다. 해탈이란 사람의 마음을 괴롭히는
악의 세 가지 근원적인 원인들인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貪嗔痴. 탐진치)이 사라지는 생생한
경험을 의미한다. 이 근원적인 원인들은 삼학을 닦음으로써 제거된다.
그러므로 붓다의 가르침은 최상의 청정, 완전한 정신적 건강, 모든 오염된 충동으로부터의
해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
정신적 번뇌로부터의 해탈, 병으로부터의 자유는 다른 인간이나 신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인간 자신의 손에 달려 있다. 붓다조차도 존재의 족쇄로부터 사람들을 풀어
줄 수 없다. 그도 단지 그들에게 풀려날 수 있는 길을 보여 줄 뿐이다.
설법들 속에서 세 가지 수행으로 언급되고 있는 계율, 선정, 지혜는 어느것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이들 각각은 목표로 가기 위한 수단들이다. 하나가 다른 것에 독립해서 기능할 수 없다.
삼각대에 다리 하나가 없으면 넘어지듯이 삼학에서도 다른 두 가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하나마저도
기능을 할 수 없다. 이 세 가지는 서로를 지탱해 주며 함께 간다.
계율 즉 절제된 행위는 선정을 강화시켜 주고 또한 선정은 지혜를 촉진 시킨다. 지혜는 사물에
대한 흐릿한 시야를 밝게 하여 있는 그대로 삶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지혜는 삶과, 삶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게 해 준다.
교리와 계율 또는 앎과 행위 상호 작용 속에서 그 두 가지는 서로 성장이라는 하나의 과정을
구성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손으로 손을 씻고 발로 발을 씻듯이, 행위는 지혜를 깨끗하게 해 주고, 지혜는 행위를 깨끗하게
해 준다." (장부 9)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붓다의 가르침을 단순한
사색이나, 실용적인 가치나 중요성이 없는 단순한 형이상학적인 교리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교도들에게 삶의 여정이란 말과 행위, 사고를 깨끗이 하는 강력한 과정이다. 그것은
스스로 계발하고 스스로 정화한다. 그것은 실용적인 결과를 강조하는 것이지 단순한 철학적
사색, 논리적인 추상 또는 단순한 생각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붓다는 그저 경전만 배우는 제자들에게 강한 어조로 경고 하였다.
"비록 신성한 경전들을 많이 암송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따라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경솔한 그는
다른 사람의 소를 세는 목동과 같다. 그는 수행장의 결실을 나누어 갖지 못한다."
"비록 경전을 조금밖에 암송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르침에 따라 행동하고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버리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마음이 완전히 해탈되어 이후로는 어떠한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면,
그는 수행자의 결실을 이룬다. " (법구경 19,20)
이러한 사실들은 무지로부터 완전한 지혜를 일깨우는 불교도들의 생활방식과 최상의 진리를 파악하는
방법은, 단순히 학술적인 지적 계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깨달음과 궁극적인 해탈로
인도해 주는 실용적인 가르침에 의존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 준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