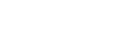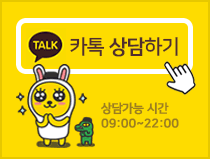페이지 정보
고승열전 |
송담 큰스님
작성자 최고관리자 23-12-14 22:17 조회 358회 0건
본문
『...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견성성불을 못해 가지고
견성성불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처를 찾고 번뇌를 버릴려고 하는데
그 생각 때문에 우리는 괴로운 것이고, 답답하고, 공부가 안 되는 것이여.
부처를 찾을려고 하지말고,
번뇌를 버릴려고 하지말어.
내가 부처인데 부처가 다시 또 부처를 찾으니까 부처가 보이지를 않는 거고,
번뇌가 바로 보린데 번뇌를 버리고 보리를 찾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부가 우리를 괴롭게 하고 마는 것이다 그 말이여.
그러면 출가해서 계행을 지키고 참선을 하는데,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본래 부처인데 부처를 왜 찾으며,
눈만 떴다 하면 번뇌 망상이 들끓고 그러는데
어떻게 번뇌를 버릴려고 하지 말아야 하냐?
수행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고대로 두라면,
뭐하러 도를 닦으며 출가를 하며
부처님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출세를 하셨느냐?
그런 생각이 날 수도 있어.
그러나 닦을 것이 없는 곳을 향해서 닦아야 하고,
찾을 것이 없는 곳을 향해서 찾아야 하고,
버릴 것이 없는 곳을 향해서 버릴 줄 알아야 해.
그 방법이 활구참선이여.
「이뭣고?」
물을 마실 때 물을 마시되, 「이 뭣고?」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되 「이 뭣고?」
빨리 터지기를 바라지도 말고
확철대오 허기를 바라지도 말고 「이 뭣고?」
알 수 없는 의단만 독로하도록 잡두리 하는 것뿐인 거여.
「이 뭣고~」 하고 있는 동안에도 별의 별 생각이 일어나거든
일어나거나 말거나 내버려 둬.
귓전에 바람 지나가듯이
바람 스쳐가듯이 내버려두고 「이 뭣고」만 챙기는 거여.
화두를 들고 또 들고,
행주좌와 어묵동정 일체처 일체시에 화두를 단속해 나가면,
들려고 안 해도 저절로 들어져.
밥을 먹어도 밥 먹은 줄도 모르고.. 밥맛을 모르고,
산을 봐도 산이 보이지 않고,
물을 봐도 물이 보이지 않고,
걸어가도 걸어간 줄 모르고,
일체처 일체시가 타성일편이 돼.
알 수 없는 의단만 독로하도록 해 나가.
번뇌망상도 버릴려고 안 해도 저절로 일어나지를 않고,
그러헌 경지에 결국은 들어가게 되는데...
...확철대오 우리는 너무 그 말을 많이 들어와 가지고
확철대오 허기를 항상 우리의 목표로 삼고
그 10년 20년 되아도 확철대오를 못허면 허송세월을 헌 걸로 생각하고
괜히 이것 오평생을 한다고 이렇게 한탄을 하게 되는데
절대로 확철대오 헐려고 할 필요가 없어.
올바른 방법으로 떡 화두를 거각하고 단속해나가면
깨달을라고 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이 공부라 하는 것은
하루 이틀에 후닥닥 해 치우고 말 일이 아니여.
평생을 해야 하는 거고 영원히 해야 하는 거고,
다만 자기의 인연 따라서 정진하는 양상이 달라질 수는 있어.
성문(聲聞)은 성문으로써 연각(緣覺)은 연각으로써
보살(菩薩)은 보살로써 또 부처님은 부처님으로써
자기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헐까 주어진 일에 따라서
도 닦아 가는 형태는 다를지언정
우리의 공부는 우리의 정진은 영원히 해야 하는 거다 그 말이여.
그래서 조금도 조급한 생각을 낼 필요가 없고,
좀 잘 안 된다고 해서 짜증을 낼 것도 없고,
잘 된다고 해서 그렇게 좋아할 것도 없어.
조급한 생각도 낼 필요가 없지만
잠시도 해태할 수가 없는 일이다 그 말이여...』
송담 큰스님
『...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견성성불을 못해 가지고
견성성불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처를 찾고 번뇌를 버릴려고 하는데
그 생각 때문에 우리는 괴로운 것이고, 답답하고, 공부가 안 되는 것이여.
부처를 찾을려고 하지말고,
번뇌를 버릴려고 하지말어.
내가 부처인데 부처가 다시 또 부처를 찾으니까 부처가 보이지를 않는 거고,
번뇌가 바로 보린데 번뇌를 버리고 보리를 찾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부가 우리를 괴롭게 하고 마는 것이다 그 말이여.
그러면 출가해서 계행을 지키고 참선을 하는데,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본래 부처인데 부처를 왜 찾으며,
눈만 떴다 하면 번뇌 망상이 들끓고 그러는데
어떻게 번뇌를 버릴려고 하지 말아야 하냐?
수행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고대로 두라면,
뭐하러 도를 닦으며 출가를 하며
부처님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출세를 하셨느냐?
그런 생각이 날 수도 있어.
그러나 닦을 것이 없는 곳을 향해서 닦아야 하고,
찾을 것이 없는 곳을 향해서 찾아야 하고,
버릴 것이 없는 곳을 향해서 버릴 줄 알아야 해.
그 방법이 활구참선이여.
「이뭣고?」
물을 마실 때 물을 마시되, 「이 뭣고?」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되 「이 뭣고?」
빨리 터지기를 바라지도 말고
확철대오 허기를 바라지도 말고 「이 뭣고?」
알 수 없는 의단만 독로하도록 잡두리 하는 것뿐인 거여.
「이 뭣고~」 하고 있는 동안에도 별의 별 생각이 일어나거든
일어나거나 말거나 내버려 둬.
귓전에 바람 지나가듯이
바람 스쳐가듯이 내버려두고 「이 뭣고」만 챙기는 거여.
화두를 들고 또 들고,
행주좌와 어묵동정 일체처 일체시에 화두를 단속해 나가면,
들려고 안 해도 저절로 들어져.
밥을 먹어도 밥 먹은 줄도 모르고.. 밥맛을 모르고,
산을 봐도 산이 보이지 않고,
물을 봐도 물이 보이지 않고,
걸어가도 걸어간 줄 모르고,
일체처 일체시가 타성일편이 돼.
알 수 없는 의단만 독로하도록 해 나가.
번뇌망상도 버릴려고 안 해도 저절로 일어나지를 않고,
그러헌 경지에 결국은 들어가게 되는데...
...확철대오 우리는 너무 그 말을 많이 들어와 가지고
확철대오 허기를 항상 우리의 목표로 삼고
그 10년 20년 되아도 확철대오를 못허면 허송세월을 헌 걸로 생각하고
괜히 이것 오평생을 한다고 이렇게 한탄을 하게 되는데
절대로 확철대오 헐려고 할 필요가 없어.
올바른 방법으로 떡 화두를 거각하고 단속해나가면
깨달을라고 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이 공부라 하는 것은
하루 이틀에 후닥닥 해 치우고 말 일이 아니여.
평생을 해야 하는 거고 영원히 해야 하는 거고,
다만 자기의 인연 따라서 정진하는 양상이 달라질 수는 있어.
성문(聲聞)은 성문으로써 연각(緣覺)은 연각으로써
보살(菩薩)은 보살로써 또 부처님은 부처님으로써
자기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헐까 주어진 일에 따라서
도 닦아 가는 형태는 다를지언정
우리의 공부는 우리의 정진은 영원히 해야 하는 거다 그 말이여.
그래서 조금도 조급한 생각을 낼 필요가 없고,
좀 잘 안 된다고 해서 짜증을 낼 것도 없고,
잘 된다고 해서 그렇게 좋아할 것도 없어.
조급한 생각도 낼 필요가 없지만
잠시도 해태할 수가 없는 일이다 그 말이여...』
송담 큰스님
견성성불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처를 찾고 번뇌를 버릴려고 하는데
그 생각 때문에 우리는 괴로운 것이고, 답답하고, 공부가 안 되는 것이여.
부처를 찾을려고 하지말고,
번뇌를 버릴려고 하지말어.
내가 부처인데 부처가 다시 또 부처를 찾으니까 부처가 보이지를 않는 거고,
번뇌가 바로 보린데 번뇌를 버리고 보리를 찾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부가 우리를 괴롭게 하고 마는 것이다 그 말이여.
그러면 출가해서 계행을 지키고 참선을 하는데,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본래 부처인데 부처를 왜 찾으며,
눈만 떴다 하면 번뇌 망상이 들끓고 그러는데
어떻게 번뇌를 버릴려고 하지 말아야 하냐?
수행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고대로 두라면,
뭐하러 도를 닦으며 출가를 하며
부처님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출세를 하셨느냐?
그런 생각이 날 수도 있어.
그러나 닦을 것이 없는 곳을 향해서 닦아야 하고,
찾을 것이 없는 곳을 향해서 찾아야 하고,
버릴 것이 없는 곳을 향해서 버릴 줄 알아야 해.
그 방법이 활구참선이여.
「이뭣고?」
물을 마실 때 물을 마시되, 「이 뭣고?」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되 「이 뭣고?」
빨리 터지기를 바라지도 말고
확철대오 허기를 바라지도 말고 「이 뭣고?」
알 수 없는 의단만 독로하도록 잡두리 하는 것뿐인 거여.
「이 뭣고~」 하고 있는 동안에도 별의 별 생각이 일어나거든
일어나거나 말거나 내버려 둬.
귓전에 바람 지나가듯이
바람 스쳐가듯이 내버려두고 「이 뭣고」만 챙기는 거여.
화두를 들고 또 들고,
행주좌와 어묵동정 일체처 일체시에 화두를 단속해 나가면,
들려고 안 해도 저절로 들어져.
밥을 먹어도 밥 먹은 줄도 모르고.. 밥맛을 모르고,
산을 봐도 산이 보이지 않고,
물을 봐도 물이 보이지 않고,
걸어가도 걸어간 줄 모르고,
일체처 일체시가 타성일편이 돼.
알 수 없는 의단만 독로하도록 해 나가.
번뇌망상도 버릴려고 안 해도 저절로 일어나지를 않고,
그러헌 경지에 결국은 들어가게 되는데...
...확철대오 우리는 너무 그 말을 많이 들어와 가지고
확철대오 허기를 항상 우리의 목표로 삼고
그 10년 20년 되아도 확철대오를 못허면 허송세월을 헌 걸로 생각하고
괜히 이것 오평생을 한다고 이렇게 한탄을 하게 되는데
절대로 확철대오 헐려고 할 필요가 없어.
올바른 방법으로 떡 화두를 거각하고 단속해나가면
깨달을라고 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이 공부라 하는 것은
하루 이틀에 후닥닥 해 치우고 말 일이 아니여.
평생을 해야 하는 거고 영원히 해야 하는 거고,
다만 자기의 인연 따라서 정진하는 양상이 달라질 수는 있어.
성문(聲聞)은 성문으로써 연각(緣覺)은 연각으로써
보살(菩薩)은 보살로써 또 부처님은 부처님으로써
자기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헐까 주어진 일에 따라서
도 닦아 가는 형태는 다를지언정
우리의 공부는 우리의 정진은 영원히 해야 하는 거다 그 말이여.
그래서 조금도 조급한 생각을 낼 필요가 없고,
좀 잘 안 된다고 해서 짜증을 낼 것도 없고,
잘 된다고 해서 그렇게 좋아할 것도 없어.
조급한 생각도 낼 필요가 없지만
잠시도 해태할 수가 없는 일이다 그 말이여...』
송담 큰스님
『...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견성성불을 못해 가지고
견성성불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처를 찾고 번뇌를 버릴려고 하는데
그 생각 때문에 우리는 괴로운 것이고, 답답하고, 공부가 안 되는 것이여.
부처를 찾을려고 하지말고,
번뇌를 버릴려고 하지말어.
내가 부처인데 부처가 다시 또 부처를 찾으니까 부처가 보이지를 않는 거고,
번뇌가 바로 보린데 번뇌를 버리고 보리를 찾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부가 우리를 괴롭게 하고 마는 것이다 그 말이여.
그러면 출가해서 계행을 지키고 참선을 하는데,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본래 부처인데 부처를 왜 찾으며,
눈만 떴다 하면 번뇌 망상이 들끓고 그러는데
어떻게 번뇌를 버릴려고 하지 말아야 하냐?
수행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고대로 두라면,
뭐하러 도를 닦으며 출가를 하며
부처님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출세를 하셨느냐?
그런 생각이 날 수도 있어.
그러나 닦을 것이 없는 곳을 향해서 닦아야 하고,
찾을 것이 없는 곳을 향해서 찾아야 하고,
버릴 것이 없는 곳을 향해서 버릴 줄 알아야 해.
그 방법이 활구참선이여.
「이뭣고?」
물을 마실 때 물을 마시되, 「이 뭣고?」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되 「이 뭣고?」
빨리 터지기를 바라지도 말고
확철대오 허기를 바라지도 말고 「이 뭣고?」
알 수 없는 의단만 독로하도록 잡두리 하는 것뿐인 거여.
「이 뭣고~」 하고 있는 동안에도 별의 별 생각이 일어나거든
일어나거나 말거나 내버려 둬.
귓전에 바람 지나가듯이
바람 스쳐가듯이 내버려두고 「이 뭣고」만 챙기는 거여.
화두를 들고 또 들고,
행주좌와 어묵동정 일체처 일체시에 화두를 단속해 나가면,
들려고 안 해도 저절로 들어져.
밥을 먹어도 밥 먹은 줄도 모르고.. 밥맛을 모르고,
산을 봐도 산이 보이지 않고,
물을 봐도 물이 보이지 않고,
걸어가도 걸어간 줄 모르고,
일체처 일체시가 타성일편이 돼.
알 수 없는 의단만 독로하도록 해 나가.
번뇌망상도 버릴려고 안 해도 저절로 일어나지를 않고,
그러헌 경지에 결국은 들어가게 되는데...
...확철대오 우리는 너무 그 말을 많이 들어와 가지고
확철대오 허기를 항상 우리의 목표로 삼고
그 10년 20년 되아도 확철대오를 못허면 허송세월을 헌 걸로 생각하고
괜히 이것 오평생을 한다고 이렇게 한탄을 하게 되는데
절대로 확철대오 헐려고 할 필요가 없어.
올바른 방법으로 떡 화두를 거각하고 단속해나가면
깨달을라고 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이 공부라 하는 것은
하루 이틀에 후닥닥 해 치우고 말 일이 아니여.
평생을 해야 하는 거고 영원히 해야 하는 거고,
다만 자기의 인연 따라서 정진하는 양상이 달라질 수는 있어.
성문(聲聞)은 성문으로써 연각(緣覺)은 연각으로써
보살(菩薩)은 보살로써 또 부처님은 부처님으로써
자기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헐까 주어진 일에 따라서
도 닦아 가는 형태는 다를지언정
우리의 공부는 우리의 정진은 영원히 해야 하는 거다 그 말이여.
그래서 조금도 조급한 생각을 낼 필요가 없고,
좀 잘 안 된다고 해서 짜증을 낼 것도 없고,
잘 된다고 해서 그렇게 좋아할 것도 없어.
조급한 생각도 낼 필요가 없지만
잠시도 해태할 수가 없는 일이다 그 말이여...』
송담 큰스님
- 이전글화엄경 금니사경전 원응 스님, 예술의 전당서 24.06.04
- 다음글부산 해림사 동림스님 23.12.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