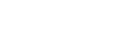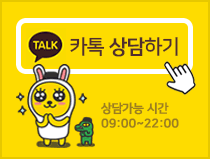페이지 정보
고승열전 |
청허당집 淸虛堂集
작성자 최고관리자 23-12-12 17:21 조회 329회 0건
본문
휴정(休靜:1520~1604).
조선 중기의 승려·승군장(僧軍將).
본관은 완산(完山)이고, 속성은 최(崔)씨며, 자는 현응(玄應)이고,
호는 청허(淸虛) 또는 서산(西山)이며, 아명은 여신(汝信)으로, 안주(安州) 출생이다.
1534년 진사시에 낙방하자 지리산에 입산, 일선(一禪)에게 구족계를 받고 영관(靈觀)의 법을 계승했다.
1552년 승과에 급제했다.
임진왜란 때 73세의 노구로 왕명에 따라 팔도16종도총섭(都摠攝)이 되어 승병(僧兵)을 모집, 한양 수복에 공을 세웠다.
1594년 유정(惟政)에게 승병을 맡기고 묘향산 원적암(圓寂庵)에서 여생을 보냈다.
묘향산 안심사(安心寺)와 금강산 유점사(楡岾寺)에 부도가 서고, 해남(海南) 표충사(表忠祠) 등에 배향되었다.
문집에 《청허당집(淸虛堂集)》이 있고,
편저에 《선교석(禪敎釋)》과 《선교결(禪敎訣)》, 《운수단(雲水壇)》, 《삼가귀감(三家龜鑑)》,
《심법요(心法要)》, 《설선의(說禪儀)》 등이 있다.
해설
청허당 휴정은 조선이 배출한 최고의 승려이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조선건국 이래 처음 맞이하는 전란의 시대였다.
수도가 유린되고, 임금이 중국으로 망명을 가느냐 마느냐하는 처지였다.
그 속에서 이 땅의 백성들은 왜적의 발굽 아래 철저하게 유린되었다.
또한 그는 억불의 시대를 살았다.
유교를 국시(國是)로 삼아 그 외의 종교는 배척되었다. 당시의 승려는 유가 문사들에게 이른바 공공의 적이었다.
그들은 국가 정책의 방향을 억불에다 맞추어 나갔다.
사회적 신분이 저하되고, 그것은 승려 집단의 질적 저하로 이어졌다.
산사불교 시대가 도래 하면서 승단(僧團)이 받은 질적․양적 타격은 엄청났다.
이 모든 악조건 속에서 스님은 조선조 불교를 부흥시켰다.
산중 승가의 풍토를 바꾸어 놓은 중흥조였다.
그리고 그의 문하에서 배출된 수많은 불제자들은 한국불교를 지탱시킨 기둥들이었다.
스님의 출가는 불우했던 가정 환경에서 비롯되었다.
스님의 전기를 알 수 있는 자료로는 두 가지 정도가 있다.
『청허당집』에 실린 「上完山盧府尹書」와 편양언기(鞭羊彦機)가 지은
「金剛山 退隱 國一都大禪師 禪敎都摠攝 賜紫扶宗樹敎 兼登階普濟大師 淸虛堂 行狀」이 그것이다.
전자는 스님이 50이 되던 해, 당대 명상(名相)이였던 노수신(盧守愼)에게 자신의 이력에 대해 허심탄회 하게 말한 것이며,
후자는 그의 법손(法孫) 언기가 지은 스승의 행장이다.
두 기록은 일장일단을 가지고 있다.
전자의 경우, 자신의 이력을 자세하게 상세하게 말하고는 있으나, 50대 이후 30여 년 간의 일대기는 알 수 없다는 맹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후자의 경우, 생애 전반을 다루고는 있으나 스승에 대한 외경심으로 부풀려지고 소략한 면도 보인다.
스님의 오도송은 특이하게도 낮닭 울음 소리에서 나왔다.
髮白非心白 머리 희었으되 마음 희지 않았다고
古人曾漏洩 옛 사람 일찍이 천기를 누설했네.
今聽一聲鷄 이제 닭 우는 소리 들으니
丈夫能事畢 장부는 할 일 다할 수 있겠네.
忽得自家底 홀연히 견성(見性) 하고 보니
頭頭只此爾 일마다 다만 이러할 뿐이라네.
萬千金寶藏 천만 금의 보물창고
元是一空紙 본래 한 빈 종이일 뿐이구려.
5언절구 두 수로 된 이 시는 깨침의 순간, 시인의 정신을 관통하고 지나간 찰라를 포착하고 있다.
세상의 명리 다툼에서 벗어나 공문(空門)에 귀의한 자로 깨침을 얻는 것은 마땅한 의무이자 목표였다.
그런데 그 깨침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사무애(事事無碍), 막힘 없이 세상에 편재(遍在)해 있다.
그리고 그 속에 내 마음이 담겨 있다.
그러므로 견성(見性)을 모든 망념과 미혹을 버리고 자기 본래의 성품인 자성(自性)을 깨달아 아는 것이라 말하지 않았던가.
친구를 찾아 떠난 길에서 때 잃은 울음을 토해내는 닭 소리에서 견성의 실마리를 찾았다.
세상 만사는 객관적 실체로서 항상하는 것처럼 보인다.
단지 인식의 주체가 어떠한 열린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 다르게 반응한다.
아니 객체는 끝내 그대로를 유지하지만[如如], 주체만이 허상(虛相)을 잡는다[一切唯心造].
스님은 낮닭의 울음 소리에서 그 진리를 찾았다.
그토록 간절히 찾아 헤매던 천만 금의 보물창조가 보잘 것 없는 종이 한 조각에 불과하였음을 깨우쳤다.
스승은 제자들을 그들의 깜냥에 맞게 길러냈다.
유정은 실질적인 법의 계승자이었지만,
당시 나라가 처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 승병장 생활을 통해 불교계의 바람막이 역할을 수행하였다.
반면 일선은 청정 구도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그는 지리산에 은거하며 평생을 참선과 염불로 일관하였다.
출가승의 본분을 온몸으로 보여주었다.
태능은 유정이 떠난 교단을 수호하며 교단 정비에 나섰다.
전쟁으로 국토가 유린당하고, 백성들이 노략질을 당하다보니 사회 질서는 허물어졌다.
피난민과 유랑민들이 겹치면서 백성들은 생계 유지가 극도로 어려워졌다.
전쟁 발발 당년(當年)의 수확은 물론이고, 전쟁 이후 전국의 농토가 30% 이상 줄었다는 것은 개인은 물론,
나라 살림이 극도로 빈곤해졌음을 의미하였다.
더구나 전쟁이 장기전으로 들어가면서 백성들은 각종 부역에 동원되었다.
무너진 성을 증축하고 수자리에 동원되느라 상업(常業)에는 힘쓸 겨를이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불교계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원래가 청빈을 가풍으로 하는 집단이기는 하지만, 종단을 이끄는 데는 큰 타격을 받았다.
억불의 국가 기조 아래 공식적으로는 탄압을 받고 있었지만,
불교는 끊임없이 일반 백성 사이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힘든 부역과 조세의 의무를 피해 스님으로 위장하는 백성들이 많아지면서
산사는 수행처로서의 모습을 점차 잃어 갔다.
또한 “어린 스님이나 늙어 기력이 없는 스님들을 빼고는 모든 스님이 궐기하라”는
청허 스님의 격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국의 건장한 스님네들은 승병으로 나가 있었다.
세속에서 속인처럼 지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이탈자는 생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무너진 종단의 질적․양적 개선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었다.
태능은 묵묵히 이 일을 수행했다.
그 자신도 남한산성의 축조에 스님들을 이끌고 직접 참여하는 등 종단의 안팎을 다스렸다.
청허 스님은 이렇게 기라성 같은 당대의 고승을 길러내었다.
스님이 가진 사문 양성의 가장 큰 도구는 바로 자신의 모습이었다.
스승과 함께 하는 삶을 통해 무젖는 도제법(徒弟法)과 함께 제자의 근기에 맞는 적확(的確)한 방편법(方便法)이 있었다.
휴정 스님은 종파가 사라진 뒤 교리적인 면에서 그 맥을 이은 분이다.
세종(世宗:1424년)은 기존 한국불교의 종파를 선교(禪敎) 양종(兩宗)으로 인위적으로 묶음으로써 불교계를 견제했다.
즉, 조계종, 천태종, 총남종을 합쳐서 선종이라 하고, 화엄종, 자은종, 중신종, 시흥종을 합쳐서 교종이라 하였다.
그리고 이마저도 1565년(명종 20)에 오면, 아예 종 자체가 사라졌다.
각 종들은 나름대로 교의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그 특징이 사회적 위축과 함께 사라져갔다.
각 종파의 종지가 서지 않고서는 교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리가 만무하였다.
한국불교사상사에서 휴정 스님의 주된 업적은 바로 이 흩어져 사라질 위기에 놓인 종지를 일신(一新)시켜 정리했다는 점이다.
스님의 사상은 조사선(祖師禪) 중심의 선교일치론(禪敎一致論)과 염불 정토관(淨土觀)의 강조라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휴정 스님은 조선조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불교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종단의 힘을 결집시키는 것이라 여겼다.
그리고 그 시발을 선교일치론에서 찾았다.
물론 이 선교일치론은 스님이 처음 제기한 것이 아니다.
대각국사(大覺國師) 의천(義天)은 새롭게 천태종(天台宗)을 만들어 교선상의,
교선합일을 내세움으로써 이 사상은 고려 불교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보조국사 지눌에 의해서도 제기된 바가 있었다.
그러나 조선조 휴정(休靜) 스님 대에 와서 두 종파의 통합을 시도한 이후,
조선불교의 대립은 종지부를 찍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1941년 선교 양종이 조계종으로 통합되는 초석이 되었다.
또한 스님은 조사선 참구의 중요한 수행법으로 화두(話頭)를 잡는 것을 강조하였다.
화두를 제대로 잡으려면,
우선 큰산이나 바다와 같이 변치 않는 수행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일거수일투족을 화두에 대한 의심으로 일관해야 한다.
이 “의심덩어리”야말로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다.
이 의심에 모든 의식을 집중시켜 일체의 잡다한 생각을 끊는다면 대장부의 기개를 날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시리도록 차가운 뼈 속에서 취모검을 든 법왕의 모습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스님은 마음과 입이 하나가 되어 아미타불을 부를 때,
육도(六途)의 윤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했다.
염불이란 아미타불의 서원(誓願)에 따라 그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서방(西方)의 극락정토(極樂淨土)에 왕생(往生)하게 된다는 정토신앙(淨土信仰)을 말한다.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 이 6자를 읽되,
한 대상에 집착하는 작용을 버려야 한다.
한 글자 한 글자를 입으로 외울 때마다 마음 속에 한 글자씩을 새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된다면, “염불 외우는 소리에 천마(天魔)의 간담이 떨어지고,
그의 이름이 저승의 명부에서 지워지며, 구품연지(九品蓮池)의 연화대에서 태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스님의 나이 72세 되던 해, 임진왜란이 발발했다.
당시 스님은 묘향산에 주석하며 정법안장(正法眼藏)과 열반묘심(涅槃妙心)의 기틀을 잡고 계셨다.
전황은 너무도 급박하게도 모든 것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손 쓸 틈도 없이 서울을 내주고, 선조는 의주로 몽진을 떠나야만 했다.
임금의 명으로, 스님은 의주 행재소로 찾아가 직접 선조 알현하였다.
이 자리에서 선조는 승병의 모집과 지휘를 스님에게 맡기며,
팔도십육종선교도총섭(八道十六宗禪敎都摠攝)에 임명하였다.
스님은 전국의 불자들에게 궐기를 호소하며,
원수부(元師府)가 있던 순안(順安) 흥법사(興法寺)로 결집하라는 격문을 전국으로 발송하였다.
결국 스님과 사명유정․기허영규(騎虛靈圭) 등
전국적으로 모인 2500여 의승병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국난 극복의 선봉이 되었다.
금산전투, 평양성 탈환, 행주대첩 등 빛나는 전과(戰果)의 뒤에는 항상 승병이 있었다.
승병은 통제와 용맹에 있어 정규군과 명군, 의병군, 의승군이 섞인 연합군에서도 선두에 섰다.
사실 전장에 나가 손에 피를 묻힌다는 것은 불제자로서의 계율에 크게 어긋난다.
스님들의 전쟁 참여는 우국의 일념과 백성에 대한 애정과 희구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청허 스님은 보제생령(普濟生靈)의 구호로 싸울 수 있는 모든 스님은 전장에 나설 것을 독려했다.
청허 스님은 선조의 환도(還都) 시 호위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승병장으로서의 임무를 마치고,
산승의 본분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1604년 1월, 묘향산 원적암(圓寂庵)에서 다음의 임종게로써 이승에서의 삶을 마감했다.
참으로 이 땅에 오신 대성인(大聖人)의 모습이었다.
현존하는 서산대사의 비문과 『동사열전(東師列傳)』에는 모두 『청허당집(淸虛堂集)』을 8권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 현행본 『청허당집』에는 2권본, 4권본, 7권본 등만이 있다.
7권본은 현재 숭정3년(崇禎三年) 경오(庚午:1630), 경기도 삭녕지(朔寧地) 용복사(龍腹寺) 간본이 남아 전하며,
4권본은 간년을 알 수 없는 묘향장판(妙香藏板)이 전해지며, 2권본은 강희5년(康熙五年) 병오(丙午:1666),
동리산 태안사(泰安寺) 개판 및 간년을 알 수 없는 몇 가지가 현존하고 있다.
각 판본들은 내용적으로 볼 때,
부분적인 첨삭이 있어 혼란을 줄 여지가 있다.
하지만 본서는 종합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7권본을 대본으로 삼아 그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청허당집》 번역서로는 한글대장경 속에 든 것과
박경훈의 《청허당집》(동국대출판국), 편역자의《청허대사 휴정시집》(민속원)이 있는데, 모두 4권본을 대본으로 삼고 있다.
《청허당집》은 한국 불교의 큰 획을 그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청허휴정의 문집이다.
승속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읽힘으로써
스님의 정신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승하는 데 일말의 도움이라도 된다면 본서의 깊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조선 중기의 승려·승군장(僧軍將).
본관은 완산(完山)이고, 속성은 최(崔)씨며, 자는 현응(玄應)이고,
호는 청허(淸虛) 또는 서산(西山)이며, 아명은 여신(汝信)으로, 안주(安州) 출생이다.
1534년 진사시에 낙방하자 지리산에 입산, 일선(一禪)에게 구족계를 받고 영관(靈觀)의 법을 계승했다.
1552년 승과에 급제했다.
임진왜란 때 73세의 노구로 왕명에 따라 팔도16종도총섭(都摠攝)이 되어 승병(僧兵)을 모집, 한양 수복에 공을 세웠다.
1594년 유정(惟政)에게 승병을 맡기고 묘향산 원적암(圓寂庵)에서 여생을 보냈다.
묘향산 안심사(安心寺)와 금강산 유점사(楡岾寺)에 부도가 서고, 해남(海南) 표충사(表忠祠) 등에 배향되었다.
문집에 《청허당집(淸虛堂集)》이 있고,
편저에 《선교석(禪敎釋)》과 《선교결(禪敎訣)》, 《운수단(雲水壇)》, 《삼가귀감(三家龜鑑)》,
《심법요(心法要)》, 《설선의(說禪儀)》 등이 있다.
해설
청허당 휴정은 조선이 배출한 최고의 승려이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조선건국 이래 처음 맞이하는 전란의 시대였다.
수도가 유린되고, 임금이 중국으로 망명을 가느냐 마느냐하는 처지였다.
그 속에서 이 땅의 백성들은 왜적의 발굽 아래 철저하게 유린되었다.
또한 그는 억불의 시대를 살았다.
유교를 국시(國是)로 삼아 그 외의 종교는 배척되었다. 당시의 승려는 유가 문사들에게 이른바 공공의 적이었다.
그들은 국가 정책의 방향을 억불에다 맞추어 나갔다.
사회적 신분이 저하되고, 그것은 승려 집단의 질적 저하로 이어졌다.
산사불교 시대가 도래 하면서 승단(僧團)이 받은 질적․양적 타격은 엄청났다.
이 모든 악조건 속에서 스님은 조선조 불교를 부흥시켰다.
산중 승가의 풍토를 바꾸어 놓은 중흥조였다.
그리고 그의 문하에서 배출된 수많은 불제자들은 한국불교를 지탱시킨 기둥들이었다.
스님의 출가는 불우했던 가정 환경에서 비롯되었다.
스님의 전기를 알 수 있는 자료로는 두 가지 정도가 있다.
『청허당집』에 실린 「上完山盧府尹書」와 편양언기(鞭羊彦機)가 지은
「金剛山 退隱 國一都大禪師 禪敎都摠攝 賜紫扶宗樹敎 兼登階普濟大師 淸虛堂 行狀」이 그것이다.
전자는 스님이 50이 되던 해, 당대 명상(名相)이였던 노수신(盧守愼)에게 자신의 이력에 대해 허심탄회 하게 말한 것이며,
후자는 그의 법손(法孫) 언기가 지은 스승의 행장이다.
두 기록은 일장일단을 가지고 있다.
전자의 경우, 자신의 이력을 자세하게 상세하게 말하고는 있으나, 50대 이후 30여 년 간의 일대기는 알 수 없다는 맹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후자의 경우, 생애 전반을 다루고는 있으나 스승에 대한 외경심으로 부풀려지고 소략한 면도 보인다.
스님의 오도송은 특이하게도 낮닭 울음 소리에서 나왔다.
髮白非心白 머리 희었으되 마음 희지 않았다고
古人曾漏洩 옛 사람 일찍이 천기를 누설했네.
今聽一聲鷄 이제 닭 우는 소리 들으니
丈夫能事畢 장부는 할 일 다할 수 있겠네.
忽得自家底 홀연히 견성(見性) 하고 보니
頭頭只此爾 일마다 다만 이러할 뿐이라네.
萬千金寶藏 천만 금의 보물창고
元是一空紙 본래 한 빈 종이일 뿐이구려.
5언절구 두 수로 된 이 시는 깨침의 순간, 시인의 정신을 관통하고 지나간 찰라를 포착하고 있다.
세상의 명리 다툼에서 벗어나 공문(空門)에 귀의한 자로 깨침을 얻는 것은 마땅한 의무이자 목표였다.
그런데 그 깨침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사무애(事事無碍), 막힘 없이 세상에 편재(遍在)해 있다.
그리고 그 속에 내 마음이 담겨 있다.
그러므로 견성(見性)을 모든 망념과 미혹을 버리고 자기 본래의 성품인 자성(自性)을 깨달아 아는 것이라 말하지 않았던가.
친구를 찾아 떠난 길에서 때 잃은 울음을 토해내는 닭 소리에서 견성의 실마리를 찾았다.
세상 만사는 객관적 실체로서 항상하는 것처럼 보인다.
단지 인식의 주체가 어떠한 열린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 다르게 반응한다.
아니 객체는 끝내 그대로를 유지하지만[如如], 주체만이 허상(虛相)을 잡는다[一切唯心造].
스님은 낮닭의 울음 소리에서 그 진리를 찾았다.
그토록 간절히 찾아 헤매던 천만 금의 보물창조가 보잘 것 없는 종이 한 조각에 불과하였음을 깨우쳤다.
스승은 제자들을 그들의 깜냥에 맞게 길러냈다.
유정은 실질적인 법의 계승자이었지만,
당시 나라가 처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 승병장 생활을 통해 불교계의 바람막이 역할을 수행하였다.
반면 일선은 청정 구도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그는 지리산에 은거하며 평생을 참선과 염불로 일관하였다.
출가승의 본분을 온몸으로 보여주었다.
태능은 유정이 떠난 교단을 수호하며 교단 정비에 나섰다.
전쟁으로 국토가 유린당하고, 백성들이 노략질을 당하다보니 사회 질서는 허물어졌다.
피난민과 유랑민들이 겹치면서 백성들은 생계 유지가 극도로 어려워졌다.
전쟁 발발 당년(當年)의 수확은 물론이고, 전쟁 이후 전국의 농토가 30% 이상 줄었다는 것은 개인은 물론,
나라 살림이 극도로 빈곤해졌음을 의미하였다.
더구나 전쟁이 장기전으로 들어가면서 백성들은 각종 부역에 동원되었다.
무너진 성을 증축하고 수자리에 동원되느라 상업(常業)에는 힘쓸 겨를이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불교계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원래가 청빈을 가풍으로 하는 집단이기는 하지만, 종단을 이끄는 데는 큰 타격을 받았다.
억불의 국가 기조 아래 공식적으로는 탄압을 받고 있었지만,
불교는 끊임없이 일반 백성 사이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힘든 부역과 조세의 의무를 피해 스님으로 위장하는 백성들이 많아지면서
산사는 수행처로서의 모습을 점차 잃어 갔다.
또한 “어린 스님이나 늙어 기력이 없는 스님들을 빼고는 모든 스님이 궐기하라”는
청허 스님의 격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국의 건장한 스님네들은 승병으로 나가 있었다.
세속에서 속인처럼 지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이탈자는 생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무너진 종단의 질적․양적 개선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었다.
태능은 묵묵히 이 일을 수행했다.
그 자신도 남한산성의 축조에 스님들을 이끌고 직접 참여하는 등 종단의 안팎을 다스렸다.
청허 스님은 이렇게 기라성 같은 당대의 고승을 길러내었다.
스님이 가진 사문 양성의 가장 큰 도구는 바로 자신의 모습이었다.
스승과 함께 하는 삶을 통해 무젖는 도제법(徒弟法)과 함께 제자의 근기에 맞는 적확(的確)한 방편법(方便法)이 있었다.
휴정 스님은 종파가 사라진 뒤 교리적인 면에서 그 맥을 이은 분이다.
세종(世宗:1424년)은 기존 한국불교의 종파를 선교(禪敎) 양종(兩宗)으로 인위적으로 묶음으로써 불교계를 견제했다.
즉, 조계종, 천태종, 총남종을 합쳐서 선종이라 하고, 화엄종, 자은종, 중신종, 시흥종을 합쳐서 교종이라 하였다.
그리고 이마저도 1565년(명종 20)에 오면, 아예 종 자체가 사라졌다.
각 종들은 나름대로 교의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그 특징이 사회적 위축과 함께 사라져갔다.
각 종파의 종지가 서지 않고서는 교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리가 만무하였다.
한국불교사상사에서 휴정 스님의 주된 업적은 바로 이 흩어져 사라질 위기에 놓인 종지를 일신(一新)시켜 정리했다는 점이다.
스님의 사상은 조사선(祖師禪) 중심의 선교일치론(禪敎一致論)과 염불 정토관(淨土觀)의 강조라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휴정 스님은 조선조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불교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종단의 힘을 결집시키는 것이라 여겼다.
그리고 그 시발을 선교일치론에서 찾았다.
물론 이 선교일치론은 스님이 처음 제기한 것이 아니다.
대각국사(大覺國師) 의천(義天)은 새롭게 천태종(天台宗)을 만들어 교선상의,
교선합일을 내세움으로써 이 사상은 고려 불교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보조국사 지눌에 의해서도 제기된 바가 있었다.
그러나 조선조 휴정(休靜) 스님 대에 와서 두 종파의 통합을 시도한 이후,
조선불교의 대립은 종지부를 찍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1941년 선교 양종이 조계종으로 통합되는 초석이 되었다.
또한 스님은 조사선 참구의 중요한 수행법으로 화두(話頭)를 잡는 것을 강조하였다.
화두를 제대로 잡으려면,
우선 큰산이나 바다와 같이 변치 않는 수행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일거수일투족을 화두에 대한 의심으로 일관해야 한다.
이 “의심덩어리”야말로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다.
이 의심에 모든 의식을 집중시켜 일체의 잡다한 생각을 끊는다면 대장부의 기개를 날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시리도록 차가운 뼈 속에서 취모검을 든 법왕의 모습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스님은 마음과 입이 하나가 되어 아미타불을 부를 때,
육도(六途)의 윤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했다.
염불이란 아미타불의 서원(誓願)에 따라 그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서방(西方)의 극락정토(極樂淨土)에 왕생(往生)하게 된다는 정토신앙(淨土信仰)을 말한다.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 이 6자를 읽되,
한 대상에 집착하는 작용을 버려야 한다.
한 글자 한 글자를 입으로 외울 때마다 마음 속에 한 글자씩을 새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된다면, “염불 외우는 소리에 천마(天魔)의 간담이 떨어지고,
그의 이름이 저승의 명부에서 지워지며, 구품연지(九品蓮池)의 연화대에서 태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스님의 나이 72세 되던 해, 임진왜란이 발발했다.
당시 스님은 묘향산에 주석하며 정법안장(正法眼藏)과 열반묘심(涅槃妙心)의 기틀을 잡고 계셨다.
전황은 너무도 급박하게도 모든 것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손 쓸 틈도 없이 서울을 내주고, 선조는 의주로 몽진을 떠나야만 했다.
임금의 명으로, 스님은 의주 행재소로 찾아가 직접 선조 알현하였다.
이 자리에서 선조는 승병의 모집과 지휘를 스님에게 맡기며,
팔도십육종선교도총섭(八道十六宗禪敎都摠攝)에 임명하였다.
스님은 전국의 불자들에게 궐기를 호소하며,
원수부(元師府)가 있던 순안(順安) 흥법사(興法寺)로 결집하라는 격문을 전국으로 발송하였다.
결국 스님과 사명유정․기허영규(騎虛靈圭) 등
전국적으로 모인 2500여 의승병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국난 극복의 선봉이 되었다.
금산전투, 평양성 탈환, 행주대첩 등 빛나는 전과(戰果)의 뒤에는 항상 승병이 있었다.
승병은 통제와 용맹에 있어 정규군과 명군, 의병군, 의승군이 섞인 연합군에서도 선두에 섰다.
사실 전장에 나가 손에 피를 묻힌다는 것은 불제자로서의 계율에 크게 어긋난다.
스님들의 전쟁 참여는 우국의 일념과 백성에 대한 애정과 희구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청허 스님은 보제생령(普濟生靈)의 구호로 싸울 수 있는 모든 스님은 전장에 나설 것을 독려했다.
청허 스님은 선조의 환도(還都) 시 호위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승병장으로서의 임무를 마치고,
산승의 본분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1604년 1월, 묘향산 원적암(圓寂庵)에서 다음의 임종게로써 이승에서의 삶을 마감했다.
참으로 이 땅에 오신 대성인(大聖人)의 모습이었다.
현존하는 서산대사의 비문과 『동사열전(東師列傳)』에는 모두 『청허당집(淸虛堂集)』을 8권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 현행본 『청허당집』에는 2권본, 4권본, 7권본 등만이 있다.
7권본은 현재 숭정3년(崇禎三年) 경오(庚午:1630), 경기도 삭녕지(朔寧地) 용복사(龍腹寺) 간본이 남아 전하며,
4권본은 간년을 알 수 없는 묘향장판(妙香藏板)이 전해지며, 2권본은 강희5년(康熙五年) 병오(丙午:1666),
동리산 태안사(泰安寺) 개판 및 간년을 알 수 없는 몇 가지가 현존하고 있다.
각 판본들은 내용적으로 볼 때,
부분적인 첨삭이 있어 혼란을 줄 여지가 있다.
하지만 본서는 종합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7권본을 대본으로 삼아 그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청허당집》 번역서로는 한글대장경 속에 든 것과
박경훈의 《청허당집》(동국대출판국), 편역자의《청허대사 휴정시집》(민속원)이 있는데, 모두 4권본을 대본으로 삼고 있다.
《청허당집》은 한국 불교의 큰 획을 그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청허휴정의 문집이다.
승속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읽힘으로써
스님의 정신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승하는 데 일말의 도움이라도 된다면 본서의 깊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첨부파일
-
2022_08_29 08_19.mp4 (16.1M)
2회 다운로드 | DATE : 2023-12-12 17:21:47
- 이전글부산 해림사 동림스님 23.12.14
- 다음글경허스님-총 14편 중 1편입니다 23.12.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